[2016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당선작 우수상] 나의 옛날이야기
함소영 방송작가
목소리가 이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 내가 들어도 그랬다.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목소리로 해 먹을 수 있는 일을 도맡아 했다. 목소리에 얼굴까지 빼어난 친구들에게 밀리기 시작할 즈음 글쓰기가 좋아졌고, 자연스레 작가의 꿈을 꾸다 우연찮게 입봉한 것이 스물셋이다. 벌써 8년 전의 이야기다.
지방의 공중파 휴먼다큐를 만들었다. 아카데미도 작가교육원도 다니지 않은, 그저 글쓰기를 좋아했고 나름 큰 상들을 받아와서 글을 쓰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나였지만 첫 시작에 17분짜리 구성이라니, 당황스러웠다. 인터넷에서 접한 방송계의 세상은 메인작가가 이끌어주고 서브작가가 거들어주며 막내는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의 풍경은 그게 아니었다.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받지도 못한 내가 바로 현장에서 스크립터에 막내에 서브에 메인의 역할을 해야 했다. 시작하자마자 입봉인 셈이다.
3주 한 번 제작이지만 총국에서 방송을 죽이라고 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땐 두 달에 한 편을 겨우 만들었다. 37만 원. 그게 내 한 달 생활비였다. 그것도 막내면서 바로 입봉한 나에게는 큰돈이라는 피디들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촬영을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다. 피디가 멀리 나가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냥 기분이 나빠서 싫고, 그렇게 아이템이 까이고 까이다 결국엔 처음 내밀었던 아이템으로 주말 촬영을 나간다. 멀리 나가기는 싫다면서 주말 촬영은 괜찮은가, 아이러니하다. ENG 카메라를 메고 산을 올랐다. 그 뿐인가. 한 쪽엔 ENG, 한 쪽 손엔 막걸리 두 병을 들었다. 자꾸 어깨가 처져 막걸리가 샜다. 촬영지에 도착해 먼저 한 일은 몫 좋은 자리에 막걸리를 두고 재빨리 젓가락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는 난 작가에서 피디로 변신한다. 촬영 디렉팅을 한다. 이제 막 시작한 내가 무얼 안다고, 어떻게 찍으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나 마감은 사흘 뒤고, 높으신 피디께선 막걸리를 먹으며 알아서 찍으라고 하니 별 수가 있나. 일단 다 담아간다. 편집구성안을 쓰는 것도, 편집점을 만드는 것도 결국 내 일이니 말이다. 할 일이 더 늘어난다. 돌아와서 취해 자는 피디를 두고 편집실에서 테이프를 본다. 한없이 본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깨어난 피디는 술국에 소주를 하잔다. 싫다고 할 수 없다. 시간은 없는데 나만 힘들고 나만 잠 못 이룬다. 그래도 지금은 막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선배들처럼 괜찮아질 거라 자위하며 작가와 잡가의 일을 해냈다.
17분 구성에 익숙해질 즈음 갑자기 프로그램을 내놓으란다. 새로운 작가의 고료를 맞춰줘야 한다고. 나는 뭘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프로그램을 준단다. 그때까지 출근은 매일하라고. 37만 원을 받으면서도 ‘괜찮던’ 난데 눈물이 났다. 아무래도 작가는 할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며 자랑한 지난날의 내 모습에, 작가가 됐다며 좋아하던 부모님의 얼굴이 스치는데 울 수가 없었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고료를 연차에 맞게 줄 수 없다는 회사의 말에 잘리듯 그만둔 마흔의 대선배가 이런 말을 해 줬다.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소영아.”
이 말만을 가슴에 새기며 버텼지만, 강하고 자시고를 떠나 버티기 전에 벗어났어야 했던 걸까 하는 물음표를 나는 여전히 달고 있다. 내가 너무 무식하게 버티기만 한 걸까. 어느새 내 나이는 서른이 넘었고, 뒤를 돌아봐도 앞을 내다봐도 남은 것은 다친 마음이라든가, 더욱 더 가난해진 내 자신이었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았다. 이제 업무는 능숙하고, 내가 맡은 프로에서 만큼은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있었다. 맡은 지 3년 만에 지역국 프로그램 평가에서 두 번이나 상위권에 랭크했다. 국장님에게 실질적 1위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내가 처한 현실에서 만큼은 여전히 부끄러웠다. 아프더라도 원고 넘기고 아프라는 말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3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된 리포터가 있었다. 7년을 동고동락한, 흔히 그들 말로 ‘식구’라고 부르던 리포터가 퇴원 후 출근을 하자마자 들은 말은 바로 그만 다니라는 말이었다. 좋게 말해 프리랜서이지 사실은 당신들 입맛에 맞게끔 막 쓰다가 아무 때나 잘라도 상관없는 이가 바로 ‘프리랜서’인 것이다.
제 기분에 따라 내 원고의 괜찮음이 결정됐다. 그러다 주가라도 떨어지면 인터뷰이가 말을 더듬거리는 것도 내 죄인 것이다. 모든 일부터 책임까지 내게 넘겨놓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토로하면 “네가 감히”, “내가 피디야”라는 말이 돌아오는 곳이다. 방송국에서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경우 직원이 달라고 하면 쓰던 화장품까지 바쳐야 한다. 받아 오라고 하면 당신이 입을 협찬 옷도 받아 와야 한다. 아들의 폼 클렌징도 대신 주문해야 했고, 자기소개서도 대신 써야 한다. 하기 싫다고 하면, 그날 이후로 기분이 풀릴 때까지 매일 까이는 것이다. 오죽하면 같이 일하는 프리랜서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것처럼 ‘연변거지’를 고용하자는 우스갯소리 아닌 말들을 했을까.
나는 ‘노동자’이고 싶다. 노동의 주체가 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이 사회가 원하는 ‘근로자’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건강한 ‘노동자’이고 싶다. 그렇기에 내 마음건강을 위해, ‘주관적 안녕감’을 위해 기꺼이 백수가 된지 이제 두 달을 채워간다. 다신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았던 방송국이지만 나는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작가 구직란을 본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거라며 용기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구직란을 살펴보는 지금에서도 마음 한 곳에서는 바리스타며, 제빵이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생각하고 있다. 작가로, 아니 ‘비정규 노동자’로 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을지 모르겠다. 스물셋에 시작해 지금은 서른한 살.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게 된 것도 몇 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쓰여지고 있다. 한 직장에서 8년을 일했으나 정당한 휴가, 실업급여, 퇴직금은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어디에 또 있을까. 무엇하나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내 어린 날들이 흘러갔고, 이제는 마냥 어리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고 싶지가 않다. 하지만 타협을 논하기엔 비정규 노동자인 나는 힘이 없다.

작가노조 유니온 구성을 위한 모임 (@함소영)
현재 언론노동조합에서 작가노조 유니온을 구성 중에 있다. 나 역시 준비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버티는 자가 강한 거라는 말을 더는 작가를 꿈꾸는 내 후배들에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부끄러운 선배가 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공식 출범을 과연 하게 될 수는 있을지, 출범 후엔 정정당당히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뜻을 함께하고픈 이들에게 초대장을 대신 해 이 글을 띄운다.
p.s. 제목처럼 부디 ‘나의 옛날이야기’로만 남길 바라본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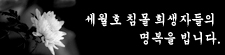


 [비정규 노동자 100명에게 듣는다] 4.13총선에서 사라져야 할 정...
[비정규 노동자 100명에게 듣는다] 4.13총선에서 사라져야 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