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직원'을 찾아라_방송국 비정규노동 체험을 통해 본 방송국의 열악한 노동환경
글|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다
2011년 6월 알바 사이트를 통해 구인광고를 찾던 중 눈에 들어온 일자리가 있었다. 방송국에서 근무, SNS 및 제보관리, 교대근무, 주말 재택근무, 4대 보험 가능 등 알바인지 계약직인지 형태는 모호했지만 탄력적(?)인 근무를 찾던 내게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해 이력서를 넣었다.
이력서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간 곳은 방송국이 아닌 K&R(가)라는 회사였다. 파견인지 용역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면접을 보러 갔고, 몇 시간 뒤 면접을 통과했다는 전화가 왔다. 합격인 줄 알고 좋아하려던 찰나, 내일 방송국 최종 면접을 보러 정장 차림으로 방문하라는 말이 이어졌다.
담당자와 최종 면접만 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웬걸,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갔지만 방송국에는 각 (파견)업체마다 데려온 6명 정도의 면접자들이 있었고, 다들 아나운서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간 내 모습에 주눅까지 들어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여유로 면접에 임한 결과, 절박함을 가진 다른 면접자들보다 활발해 보인다며 최종 합격을 거머쥐었다.
들어가서 직접 일하며 겪어 본 방송국에는 정말 다양한 업무와 역할들이 있었다. 방송국 하면 배우와 예능인, 기자와 PD, 앵커(아나운서)는 물론 카메라, 음향, 조명 등의 제작자들이 연상될 것이다.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일투성이다. 기자들이 신속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운전을 담당하는 기사들이 있고, 뉴스를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인코딩하는 담당자들이 있으며, 이를 또 SNS으로 유포하는 업무가 있다. 행정담당 직원들이 각 부서마다 있으며, 기자처럼 아이템 선정, 섭외, 취재까지 해내야 하는(하지만 “내일부터 나오지마.” 하면 그만인) 작가들이 있으며, 24시간 방송 제작을 위해 계속 재생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료조사요원, 오디오맨, 편집기사, 리포터 등 방송국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많고 다양한 일들과 업무, 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나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방송사의 뉴스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요즘(Daum에서 발행했던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미투데이에 꾸준히 올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담당하는, 뉴스 SNS 담당자였다.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SNS가 운영되어야 했기에 3명이서 오전/오후/휴무로 교대 근무를 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재택근무로 진행했다. ‘팔로워 수’나 페이지 ‘좋아요’의 숫자로 소통을 잘 한다 말할 수 없음에도, 타 방송사와의 ‘팔로워 수’ 경쟁에 매일 보고, 주간 보고를 아침마다 올리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더 험하고 더 열악한 노동환경이 많았기에 이 정도의 부담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처지도 되지 못했다.
트위터 관리도 파견직이라니
방송국의 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다. 약 5~6,000여 명이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 1,500명 정도만 방송국 직원이라고 했다. 심지어 인터넷뉴스(TV로 송출되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뉴스가 따로 있다) 아나운서도 계약직·비정규직이다. 출입증에도 티가 난다. 방송국은 어찌나 법을 칼같이 준수하시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까지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나의 경우, 2011년 6월 20일에 입사해 2013년 6월 19일로 계약이 정해져 있었으며, 일을 잘 해도 더 이상의 연장은 애초에 없다는 것을 입사 시 못 박아 두었다.
일에 적응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점점 커졌다.
‘그래도 SNS 관리야 금방 배우니 제작을 하는 사람은 정규직이겠지.’ 싶었지만 인터넷뉴스 제작파트 8명 중 정규직은 단 1명이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략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니 정규직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2/3는 파견 계약직이었다. 업무부서마다 있는 행정직은 정규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서별로 재정을 담당하고 근퇴 기록을 정리하고 탕비 부품부터 회식 챙기기 등 부서의 실무와 행정을 도맡아 하는 일은 쉽게 적응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지만 그 또한 2년 이상의 연장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계약직이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일의 고단함, 근로환경의 열악함, 정규직과는 다른 복지혜택 뿐만이 아니다. 가장 큰 피로는 ‘불안감’이다. 2년 뒤 자동 계약해지되어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직장으로 자리를 잡든지 끝나자마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늘 안고 살아야 한다. 입사의 기쁨을 느끼자마자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아이러니랄까.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하는 일들은 프로젝트 성이나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방송국의 일상 업무이자 중요한 일이기까지 하다. 나를 포함해 3명이 속해있는 SNS팀이 손을 놓으면 방송사의 뉴스 SNS는 운영되지 않으며, 운전기사가 펑크가 나면 신속함이 생명인 뉴스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정규직의 또 하나의 문제는 청년들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갖게 하지 못하고 ‘단순 노동’으로 소모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내가 했던 일도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전문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해외 뉴스들의 SNS 사례와 방향을 분석하고, 적용해보고, 시도해보고, SNS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또 이를 방송국 내부로 가져와 피드백 하는 일은 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지 모른다. 실제 해외 언론사들은 비중 있게 SNS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유연화와 비용절감에만 꽂힌 방송사는 노동의 질, 업무의 질은 관심에도 없고 타 방송사보다 높은 ‘팔로워 수’에만 만족해하고 있으니.

누구와 함께, 누구를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몇 년 전, 언론노조가 100일이 넘는 파업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방송에 큰 차질은 없었다. 노조 조직률이 예전 같지 않으려니 했는데 방송국에서 본 현실은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으니 파업에 영향이 없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은 이렇듯 개인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런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언론노조 KBS 본부의 조합원들은 파업을 진행 중이지만 바로 옆 자리에 앉아있는 KBSN(자회사)의 조합원은 파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요구가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사업주도 다르며, 함께 힘을 모을 사람들조차 파편화되어 있는 현실. 비정규직은, 파견직은, 외주화는 그래서 더 무섭다.
일본에는 민영방송노조연합 산하에 방송스태프유니온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작가협회는 최저기본 계약을 통해, 영국의 연출자협회는 연출자 권익안을 통해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당시 30%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비율을 60%까지 올리려 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언론노조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파견노동자와 외주제작의 문제를 전면에 걸고 싸우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잠시 품어보았으나, 언론노조는 언론정상화와 공정보도를 지키는 것만도 벅차 보인다.
청년유니온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국 기자나 작가들에게서 취재 요청이 온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중 있는 의제로 다루는 것은 다행인 일이나 방송국 내 고름부터 짜내야 하지 않을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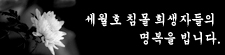


 법에 기댈 수 없는 청년노동의 문제_청년유니온이 블랙기업에 맞...
법에 기댈 수 없는 청년노동의 문제_청년유니온이 블랙기업에 맞...
 노동자의 벗, 줄여서 ‘노벗’
노동자의 벗, 줄여서 ‘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