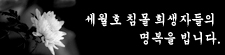길날 농사짓는 사람
생은 쓰이고, 지워진다. 우리는 시간을 연필인 양 거머쥐고 삶을 써내려간다. 꼭꼭 누르며 쓰다 보면 어느 틈에 분질러져버리곤 하는 연필심처럼 시간은 자주 부러진다. 생의 의지 또한 무시로 꺾인다. 태어났으니 어떻게든 삶을 써나가게 마련이지만, 틀렸다고 아쉽다고 부끄럽다고 이미 쓴 것을 그때마다 지우고 새로 쓸 수는 없다. 지우는 건 죽음이 하는 일. 애써 기록해온 삶이 자연스럽게 지워지든 어이없이 지워지든, 심지어 그것을 스스로 직접 지우게 되든 지워지는 건 단 한 번, 죽음을 통해서다. 말하자면 산다는 건, 죽는다는 건 그런 것이다.
2다스 분량의 연필, 24자루를 깎았다. 8칸 공책과 지우개도 준비했다. 마을의 여자 어르신들과 한글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아들들이 학교에 갈 때 농사일이며 집안일을 거들거나 동생들을 업어 키우다가 시집와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온 칠팔십 평생-보람차고 재미나기보다 지치고 팍팍했을 때가 더 많았을 것 같지만 어떻게든 견디고 이겨내 온 분들이었다. 수고롭게 살아내느라 기운을 다 써버려 말랑말랑해진 그 몸들 곳곳에 자리 잡은 그윽한 주름들의 온기와 깊이를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었다. 늙어간다는 것, 생이 죽음 가까이 이울고 있음을 어찌 받아들이고들 있는가도 궁금했다. ○○의 엄마로, △△의 ‘마누라’로, ‘■■댁’이라는 택호로 호명되며 살아온 당신들의 본명을 알고 싶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서로 보듬어가며 한 마을에서 수십 년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던, 단단한 지혜를 품게 된 내력을 여쭙고도 싶었다. 배운다는 것, 읽고 쓰는 일이란 당신들께 무엇이었는지, 살아오는 동안 배울 수 없어서, 읽고 쓸 수 없어서 많이 불편하거나 서럽지 않았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일주일에 이틀, 마을회관에서 모여 2시간가량 함께 공부한 후 밥상을 차려 어울려 밥을 먹었다. 처음엔 세 분과 시작했다. 학교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아예 다니질 못했거나,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자진해 “틀었거나”, 어찌어찌 소학교는 마쳤지만 쓰는 게 서툰 채로 나이 들어온 당신이 오셨다. 여든 안팎의 어른들과 자음 14자의 순서와 이름을 새로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다. 자음→단모음→이중모음→받침 등의 순서로 한글을 익힌 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읽고 써 보기, 그림책의 글자들을 필사해서 낭독하기, 마지막 시간엔 자녀들을 비롯한 가까운 이들에게 짧은 편지를 써서 발표하는 것으로 졸업식(?)을 대신할 작정이었다. 떠듬떠듬 읽을 줄은 다들 아셔서 ‘쓰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두어 달 만나서 익히면 되겠다 싶었다.
어느 날은 세 분, 어느 날은 네 분이 오셨다. 몇 분이 더 기웃기웃하셨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은 세 분 정도였다. 복습하시라고 내어드린 숙제도 열심히들 해오셨다. 진지했다. 회관 한쪽에 계시던 어른 몇 분이 그 나이에 배워 뭣하냐고, 광주 가고 서울 가는 버스 정도 알아서 탈 줄 알면 된다고, 어릴 때야 총명해 머리가 잘 돌아가지만 이제는 안 돌아간다고(그러니 애쓰지 말라고, 지금처럼 살면 되지 머리 아프게 뭘 배우냐고) 들으라는 듯 얘길 해도 꿋꿋하셨다. 이따금 간식을 조금씩 챙겨가서 드시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공부시간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며 안 드셨다. 쉬는 시간도 없이 흘러가는 두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어 있곤 했다. 가난과 가부장제의 그늘이 깊고 집요한 시공간 속에서 겪어야 했던 사는 일의 막막함 속엔 읽고 쓰는 일의 막막함도 깃들여 있었을 테고, 어쩌면 그 기억이 여태껏 남아 당신들을 그 자리에 붙들어 매기도 하는 거라고 짐작해보곤 했다. 공책의 여백까지 자음과 모음으로 채워가던 당신들, 옆자리 도반이 헷갈려 하며 글자를 끝내 틀리게 쓸 때 안타까워하던 모습···. 뭐든지 아끼고, 서로 나누며 도우려는 태도가 저리 성실하고 검박한 성정으로 깊어져온 것이지 싶었다. 수행하듯 살아온 까닭일까. 그래서 이분들 얼굴에서는 세대를 떠나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앓게 되는 결핍감과 불안감이 만드는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 늙어감, 나이 듦을 경원시하다 못해 혐오하며 팽팽하고 빛나는 것들을 떠받드는 시대에 이분들은 낮게 뜬 총총한 작은 별 같다.
최근 최영미 시인이 한 계간지에 시인, 고은을 두고 쓴 〈괴물〉이라는 시가 화제가 되었다. 고은의 성추행은 ‘그 판’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출판 쪽 일에 관여하고 있는 몇몇 지인으로부터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며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거대 문단권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그 고매하다는 시인의 추악한 면면이 마침내 폭로되는구나 싶어 내심 쾌재를 부르기도 했다. 고은 시인은 1933년생, 올해 85세다. 읽고 쓰는 일을 업으로 삼아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져온 인물이다.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온 그의 고질적인 성추행/성폭력 관련 얘기가 향하는 방향을 예의주시하던 중에 나이란 걸 먹을 만큼 먹은 이 시인의 얼굴과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마을의 여자 어르신들 얼굴이 동시에 떠오르곤 했다. 욕심 없이 뚜벅뚜벅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을 어르신들이 글자 한 자 한 자를 서툴지만 또박또박 정성들여 써내던 모습과, 수많은 ‘절창’을 ‘뽑아내며’ 문단의 ‘원로’로 대접받아온 시인의 추한 모습이 대비되어 생각났던 것이다. 아아, 정말이지 저렇게 늙어가선 안 되지, 마을 어르신들처럼 늙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신에게 되풀이하여 물을 수밖에 없었다. 지식이며 펜의 힘을 통해 얻게 된 것들을 삶의 안온한 지혜로 벼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 시궁창에 구겨 처넣은 자들이 일으켜 온 이러한 오래된 소란들을 접할 때마다 배운다는 것, 안다는 것, 쓴다는 것은 당최 무엇인가 묻고 싶어진다.
한글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 당신들께 여쭙지 못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살아오는 동안 잘 비우고 내려놔 왔으므로 아마도 크고 둥글고 가벼워진 영혼을 지녔을 이분들과 천천히 사귀어가며 보드랍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 가리라. 당신들이 그 순한 눈을 반짝이며 공부에 집중할 때 괜히 아프고 슬프고 기뻤다. 읽고 쓴다는 것이 이분들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소박하며 재밌는 놀이가 되기를, ‘삶이란, 또 죽음이란 이를테면 이렇고 이런 거’라는 이야기를 말하기와 듣기와 읽기와 쓰기를 통해 당신들과 오래 오래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