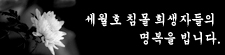길날 농사짓는 사람
내가 사는 여기 남도 마을에 저 멀리 강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사를 온다고 했다. 불과 몇 달 전에 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비교적 젊은 여성이라고 했다. 이웃집 담벼락 너머를 바라보며 이팝꽃이 어여쁘게도 피었구나··· ··· 중얼거리던 어느 환한 봄날이었을 것이다. 이윽고 그녀가 이웃집 건너 건너 담장 낮은 그 집에 두 어린 아들과 도착하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둘이서 얘기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 두 달가량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쯤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들을 물어봐도 결례는 아니겠구나, 싶은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자신의 영혼은 만나야 하고 봐야 하고 해야 할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그래서 어딘가로 흘러가는 중에 이리로 흘러온 듯하다고. 우리는 각자가 지닌 생의 지도를 펼쳐가며 어떻게든 제 갈 길을 찾아가기 마련인 것 같다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마주해온 많은 이들이 자신에겐 스승이고 가족이고 그 모든 것이었다고. 사람들에겐 ‘연대 본능’ 같은 것이 있다고 느껴왔다고도 했다, 그 연대의 기운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힘을 실어 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녀에게 물었던 것, 들으려 했던 건 그녀가 지니고 있을 거라 나 혼자 (착각하며) 막연히 짐작했던 고통과 슬픔의 맨얼굴 혹은 애도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녀가 들려준 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일궈낸 기도며 사랑이며 소멸이며 발원과 같은 슬픔과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는 ‘수행’의 언어였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희로애락, 이승의 강을 담담히 건너는 중인 자의 깊고 낮은 표정을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읽을 수 있었다.
시를 쓰고 사진을 찍고 각종 인쇄물을 디자인하고 글쓰기를 가르치고 공장과 카페에서 일을 하는 한편 이런저런 문화 공간 등을 오가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 서른 즈음, 산속에서 살고파서 산으로 갔다. 농사짓는 옆지기를 거기서 만났다. 어릴 적부터 자신은 앞으로 결혼이란 걸 하지 않을 거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사람의 일이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었는지 그와 결혼하여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다. 농사짓는 8년은 매번 달랐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펼쳐졌다. 지루함을 못 견뎌하고, ‘잘’ 소멸해가기를 발원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농사는 아름다운 사라짐을 위한 최선의 ‘바탕’이 되는 일로 다가왔다. 기꺼이 농사에 매진하는 동안 2년 터울을 두고 두 아이가 차례로 태어났다. 협동조합을 일궈 도시의 회원들에게 정성껏 꾸러미를 꾸려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며 그녀 생애 어느 때보다 단조로운 듯 풍요롭던 여덟 해가 흘러갔다.
이렇듯 평화로이 차오르던 일상에 금이 간 건 한 해가 저물어가던 지난 겨울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자연 재배 농부 공부 모임에 다녀오는 길에서였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옆에서 운전 중이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죽음과 관련해서라면 그랬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중심에 놓이는 소멸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떠난 적 없었다. 그랬건만 자신이 아닌 ‘그 사람’이 먼저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와 아이들만이 살아남았다. 마음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된 헤어짐이 고통스럽지 않을 리 없었다. 삶의 의지가 꺾일 때마다, 하여 생에 대한 체념과 방관과 비관의 그림자가 그녀를 휘저을 때마다 고삐 역할을 해준 건 아이들이었다. 사고 후유증으로 좋아하는 농사를 짓기 힘들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것도 아이들이었다. 아이들과, 무시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기에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SNS(Social Network System)로 맺은 인연을 통해 저 멀리 강원도 양양에서 이곳 전라도 장흥으로 왔다. 어디론가 떠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던 때, 일면식도 없던 장흥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한 번도 와 본 적 없는 이곳으로 그녀를 이끌어주었다. 이삿짐을 날라다 주고, 집들이에 와서 그녀와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었다. SNS가 지닌 긍정적인 면을 통해 이제껏 관계를 잘 일궈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들과 그이들이 있어 불안하지 않았다. 생계도 영혼의 길도 어떻게든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마흔을 갓 넘긴 그녀의 20대 때 꿈은 ‘흰 머리칼 휘날리며 청바지 입고 몽골의 초원을 말 타고 달리는 할머니’였다.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생애의 사건이라 할 만한 큰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마련이라지만 여전히 그녀가 그리는 미래는 이 꿈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니 ‘큰일’을 겪고 난 후 꿈은 더 확고해진 듯도 싶다. 살아오면서 줄곧 그런 편이었으나 지금은 더더욱 드러나고 재단되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래서 가볍다. 아이들이 다 자라면 모든 애착을 끊고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 것이다.
정주하기 어려운 시대, 위험과 재난이 일상인 체제의 시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이가 떠돌며 살아가는 시대, 고독이 실존의 확고한 아우라로 자리잡은 시대-우리는 어렵거나 쉽게, 어쨌든 떠나고 쉬이 머물지 못한다, 편히 깃들이지 못한다. 온갖 사건 사고와 갖가지 사연을 지닌 이별로 인해 원치 않는 ‘탈주’를 감행해야 하는 시대에 그녀, 자진하여 탈주와 유랑을 꿈꾼다. 그런 그녀에게서 감지되는 건 내려놓고 비우며 자신의 영혼을 연마해온 이의 자유로운 진중함이랄까, 어떤 단단함이다. 언제라도, 어디에라도 가벼이 내려앉아 몇 시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발 딛고 선 그곳에서 한껏 거닐고 노닐고 꿈꾸다가 훨훨 바람처럼 떠날 모습이 그려진다. 어느 날 문득, 이 남도의 농촌으로 내려와 이웃이 되어준 그녀가 다시 떠날 그날까지 ‘온전한’ 소멸과 탈주에 관한 얘기들을 가끔씩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기쁘겠다. 그것은 내 오래된 관심사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