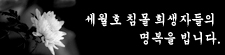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비정규노동>과 사람들] 현장의 숨소리까지 담고 싶었어요 -임인분
1. <비정규노동>을 만드시면서 투쟁 현장을 취재해오셨는데요.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센터 기자로 처음 맡은 현장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특수고용’이 뭔지, ‘간접고용’이 뭔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센터 기자여서 어디를 가든 새로웠습니다. 센터 기자 초기에 가장 자주 취재했던 곳은 재능교육지부였습니다. 재능교육지부 노동조합 간부수련회에 따라가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강의를 넋 놓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2년 7월, 그 무렵엔 딱히 특수고용 사업장이 아니어도 어딜 가든 재능교육지부 노동자들이 있었고, 당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었습니다. 그 조직이 있어야 집회든 수련회든 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런 조직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정종태 위원장을 국립암센터에서 만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 나으면 멋진 연애 하고 싶다.”던 인터뷰는 그와 한 첫 영상인터뷰이자 마지막 인터뷰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있을 때 더 잘 해야지 싶습니다.
이후에도 화물연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덤프연대가 그 뒤를 이어 비정규직 싸움을 이어가다 잦아듦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보았지요.
2. <비정규노동>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잡지이기도 하지만 센터의 정책을 외부로 알리는 잡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센터의 회보로서 회원들과 호흡해야 하는 잡지이지요. 위 세 가지를 동시에 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비정규노동>을 작업하시면서 이를 위해 어떤 고민들을 해 오셨는지요.
당시는 월간지<비정규노동>과 웹매체<워킹보이스>에 기사와 동영상의 취재물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센터 활동이 가장 활발하던 때, <워킹보이스>의 기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능한 빨리, 정확히 취재해 게재해야 했는데 기자의 역량과 욕심이 어긋나서 늘 힘들었죠. 기자로 어느 정도 현장에 익숙해졌을 때쯤 너무 많은 얘기를 담으려고 애쓰다가 월간지와 웹매체가 지루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점은 3~4시간짜리 전비연(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수련회 회의 녹화물을 녹취로 풀어 월간지에 구구절절 담아낸 적이 있었죠. 내가 고집하고 박종식 차장은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 기사는 찬반이 분명하죠. 현장이 궁금한데 못 가본 사람은 자세한 상황이 ,요점만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길다 싶고.
현장에서는 늘 현장에 있는 기자를 원하고,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 쓰는 시간과 현장에 있는 시간이 조화롭기를 바라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이죠. 취재원들에게 글을 맡기는 일도 나름 공을 들였으나 늘 부족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취재원들 원고에 원고료를 주는 일에도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센터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하기도 바쁜 취재원들을 괴롭히는 일이 아닌가 싶어 주저하게 된 적도 있어요. 자체 역량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비정규노동>을 제작하면서 겪으셨던 재미있거나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즐거웠던 기억은 특별히 없어요. 굳이 꼽자면 이 현장 저 현장 다니며 찍어온 사진자료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냈을 때, 아니면 공 들여 받아낸 외부원고 가운데 마음에 드는 글을 받았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느 매체 발간자들도 겪는 일이겠지만 제 아무리 교정을 잘 본다고 해도 늘 오타나 오류는 있었어요. 현장은 절박했고 내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 나눌 사람은 없고 취재거리는 많으니, 쓸 기사는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 끝없이 되풀이됐습니다. 월간지 완성도는 둘째 문제였죠. 늘 마감일을 넘겨 발간하게 되니 압박감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만들고 나면 또 다음 호는 제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월간지가 ‘내 개인문집이구나’ 싶었을 때 가장 괴로웠어요.
4. <비정규노동>을 만드시면서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요.
현장에 갈 때 가능한 기관지를 몇 권씩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조직이나, 마음에 드는 조직, 취재원에게는 무료발송도 주저 없이 했어요. 그 ‘주저없음’이 센터를 힘들게 한 원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또한 센터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뭐 딱히 도와드린 일 없는데도 “동지, 동지” 하고 불러주는 취재원들에게도 그냥 줬어요. 그러면서 되도록 오래 현장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 낯빛, 숨소리까지 담아두고 기억했다가 기사 쓸 때 참고하려고 애썼죠.
5. 독자들에게 들었던 <비정규노동>에 대한 평가나 감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소장님으로 계신, ‘이남신 독자’가 주봉희 위원장 시를 센터에서 손질해 월간지에 싣는 일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당시 싸움 현장에 없던 사람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현장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센터 매체는 지루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봉희 위원장님이 올려주셨던 거칠지만 생생했던 시 덕에 매체를 덜 지루해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결과물이 센터에서 시집으로 묶여 나올 때, 비록 내가 힘을 보탠 것은 없었지만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글쓰기모임 소식도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설픈 기자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희로애락을 퍼뜨려주기를 바랍니다.
6. <비정규노동>에 바라시는 점이 있나요?
100호 째나 되는 기관지를 지닌 조직은 ‘버티고 있다’는 자괴감보다는 살아남긴 했는데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될 테지요. 늘 그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이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나 같은 독자에게 센터 매체가 잘 읽히는가, 기다려지는가를 생각해보면 바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이 답을 해놓고도 기분은 편치 않습니다만 달라진 제작환경과 조건과 같은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100호 째 발간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