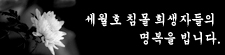아버지는 늘 아팠다. 그 불편한 몸이 더 이상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병환 때문에 가족 안에서 존경받지 못했다.
내가 초등학교 3~4학년쯤 일이다. 아버지는 리어카로 과자 도매 납품업을 했는데,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끌던 리어카에 치여 병원에 실려 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렵 큰형에게 업혀서 집에 왔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러잖아도 상경하기 전 화순탄광에서 사고를 당해 불편했던 몸이 반신불수가 되었다. 이따금 지금의 공공근로와 비슷한 개념인 ‘취로사업’을 나가 쌀이나 밀가루, 혹은 라면을 받아 오는 게 벌이의 고작이 되었고 그것도 계절에 한 번 정도였다. 그 외에는 거의 매일 동네에 비슷한 처지의 또래 몇 분이 비좁은 단칸방에 둘러앉아 낱개 담배를 걸고 화투를 했다. 기관지도 좋지 않던 아버지는 숨넘어갈 것처럼 콜록거리면서도 연신 ‘새마을담배’를 피워댔고, 비좁은 방은 안개가 낀 듯 자욱했는데, 그 냄새에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지금도 그런 냄새는 친근하다. 가끔씩 찬장에 있던 국물용 멸치를 안주삼아 소주를 마시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대개 화투판이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데는 상당히 서툴렀다. 평소에 다정하다거나 자상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가령 연을 만들겠다고 혼자서 재료를 앞에 놓고 낑낑거리다가 포기할 때 쯤 되면, 나를 툭 밀치고 설렁설렁 말없이 만들어 놓는 식이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식구들이 서로에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 그런데 극히 예외인 사건이 있었다. 그날도 아버지는 그 멤버들과 방 안 가득 연기를 피우면서 둘러앉아 있었는데, 나와 형이 토닥거리기 시작했다. 시끄러워지자 성질 급한 아버지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있던 두 아들을 양팔로 하나씩 끌어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는 형젠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다. 형과 나는 놀랐고 아버지와 함께 울었다. 한 구석에 포개져 있는 이불 속에 파묻혀서 잠들었다. 아마 겨울이었나 보다.
아버지가 또 쓰러졌다. 방 한 칸에 옛날식 부엌, 그리고 다락방을 가진 가구들이 연립으로 1호부터 13호까지 길게 늘어선 단층짜리 건물에 살았다. 13호 끝에 옛날 학교 화장실 같은 공동 화장실이 있었으며, 우리 집은 2호여서 화장실과의 거리는 30~40m정도 되었던 것 같다. 여길 다녀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갔고 가서도 부축을 해야 했다.
돌아가시기 1년 전 쯤. 내가 중학교 2학년이던 82년부터 아버지는 결국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어느 날 엄마와 작은누나가 엄마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상대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엄마 옷을 자신의 옷이라고 끌어안고 아무리 잡아 당겨도 놓아주질 않는 것이다. 아버지는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히죽히죽 웃었지만 나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부엌으로 뛰어나갔다. 평소 아버지가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가 보였다. 그 지팡이를 거꾸로 쥐고 아버지를 때렸다. 엄마 옷을 쥐고 있는 손, 발버둥치는 다리, 옷고름이 풀어헤쳐진 몸통을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때렸다. 때리면서 울었다. 발악을 했다. 그 상황이 몸서리치게 싫었다.
이듬해 봄 음력 3월, 아마 일요일이었을 것 같다. 마땅히 갈 곳이라고는 집 앞에 있는 ‘용마산’밖에 없던 나는 습관처럼 아침부터 혼자서 산엘 갔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나에게 입장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혼자서 흥얼거리거나 중얼거려도 괜찮았고, 철 따라 약간의 간식거리도 있었다.
높지 않은 산 정상에 거의 올랐을 무렵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왔다. 주머니에는 처리할 아무것도 없었다. 적당히 넓은 나뭇잎 몇 장을 주워서 마땅한 자리를 잡았다. 처리할 때 나뭇잎이 찢어지고 손에 묽은 설사가 묻었다. 더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몹시 화난 표정과 붉어진 눈으로 딱 한마디 했다.
“네 아버지 죽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분노가 추상(秋霜)같았다.
“그 많은 자식 중에 어떻게 마지막을 본 놈이 단 한 놈도 없느냐.”
엄마의 붉은 눈이 그렇게 말 했고, 추상같은 표정이 그렇게 막내아들인 나를 때렸다.
끝내 엄마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삼십 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엄마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엄마가 그렇게 모질어야 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아버지는 포개놓은 이불더미에 기대어 반쯤 누워 계셨다. 반쯤 벌어진 입가에는 하얗게 침 흘린 자국이 남아있었고, 다리는 자연스럽게 쭉 뻗은 상태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아마 62년 만에 가장 편안하게···.
내가 본 아버지의 가장 편안한 표정이었다. 담배연기 절은 사랑방 냄새가 문신처럼 가슴에 각인되고 있었다.
유재형 | 68년생 평밤한 한 아들의 아빠이며 남편입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좋은 사람들의 향기에 취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면서도 함께 수다 떨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