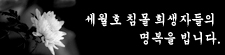지난 글쓰기모임 뒤풀이 때 2차까지 남았던 이들이 작당모의 했던 바로 그날이 왔다.
D-day 전날, 같이 모의 했던 두 사람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비보를 듣고 살짝 갈까말까를 망설였지만, 바쁜 일정에 ‘이제 아니면 또 언제 산을 오르리···.’하는 맘으로 가기로 결정한 터였다. 겨울산행이기에 아이젠부터 먼저 챙기고 나머지 필요 물품은 대충 배낭에 쑤셔 넣었다.
약속시간을 10여분이나 훌쩍 지나서 도봉산역에 도착할 즈음 희끗희끗한 머리의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우연찮게 같은 전철을 탄 강동지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몰래 다가가 “에비”하고 등을 툭 쳤지만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다. 지금 생각해 보건데 ‘아마도 술이 깨지 않아 비몽사몽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싶다. 도봉산자락 근방에 도착하자, 어제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강동지의 ‘어묵으로 속풀기’가 포장마차에서 잠시 이어졌다. 그리고 나서 점심끼니인 김밥을 사기로 했다.
평일이라 그런지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던 김밥노점상들이 좀처럼 보이질 않아 우린 김밥 찾아 삼만리를 해야만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김밥을 공수하고 나니 어영부영 11시다.
산 입구에서 도봉탐방지원센터 – 천축사 – 마당바위 – 신선대 이렇게 오늘의 등산코스를 정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음주 등산하는 강동지를 보면서 ‘이거 이거 혹시 오늘 일 치르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도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다.
도봉탐방지원센터를 지나 천축사에 도착해서 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였는지 부속건물이 덧대어 지어져 있었고, 단청 무늬 색 또한 뚜렷하고 선명하다. 법당 댓돌에는 불자들의 것인지 모를 신발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평일이라 부산스럽지 않고 조용해서 둘러보기는 좋았다. 절에서 무료로 점심공양을 하였으나 힘들게 구한 김밥에게 미안해서인지 아님 배가 덜 고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혹도 멀리하고 다시 산을 올라갔다.
점점 올라갈수록 힘도 들고, 숨도 차고, 땀도 나서 잠시 쉬기로 하였다. 강동지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생강차를 꺼내 건네주었다. 본인은 더 맛있는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강동지가 챙겨온 물품들을 보니 제법 산악인의 포스가 느껴졌다. 보온병, 술병, 접이의자, 그리고 영화 ‘박쥐’가 생각나는 그 이상한 물 호스(?) 등등···.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 내 배낭 속에 먹거리가 별로 없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다.
그 미안함도 잠시, 휴식을 취한 우리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을 오를 때 마다 아이젠이 끼워진 등산화 밑으로 뽀득뽀득 눈 밟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그리 싫지 않았다.
오르고 또 오르자 머리 위로 여럿의 사람들이 평평한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마당바위다.
바위 위에 다 오르고 보니 사람만 쉬고 있는 게 아니었다. 얼핏 보기에도 비만인 고양이 다섯 마리도 같이 쉬고 있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먹이를 찾아 사람들 근처로 모여든 것이었다. 사람들이 신기한 듯 그 고양이들을 어르기도 하고,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였다. 나도 가져간 디카를 꺼내서 형제인 듯 보이는 통통한 놈 두 마리를 렌즈에 담았다. 그리고 덤으로 강동지도 한 컷 찍어주고 멀리 산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찬 기운과 함께 뭔가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 밀려왔다. '옆의 강동지도 그러했을까?'
더 가파른 바위들을 하나둘씩 밟고 올라가니 숨이 턱까지 찼다. 콧물도 나왔다. 더 올라가니 이제부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계단이다. 산에 오르기 전 음주등산이라고 내심 불안하고 미덥지 않아했던 강동지는 저 만치 위에 올라가 있었다. 괜히 얕잡아 봤나 보다. 내가 이렇게 지구력이 딸리다니. 에고 힘들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동지를 따라 잡으려고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갔다. 계단이 다 끝나자 이번엔 바위에 쇠막대로 이어진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야했다. 팔의 근력을 요하는 만큼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한발 두발 조심조심 올라갔다. 서서히 뿌옇게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야호.
신선대에 올라가니 안개가 끼고 날이 흐려서인지 앞이 잘 보이진 않았다. 게다가 약간의 눈보라까지 있어서 더더욱. 하지만 앞이 보이건 말건 땀 흘리며 올라간 산 정상에서 느끼는 성취감의 기쁨을 그 무엇에 비할쏘냐.
산 아래와는 다르게 매섭게 부는 찬바람과 등산객들이 계속 올라오는 통에 간단한 인증샷을 찍고 점심을 먹기 위해 하산을 시작했다. 내려오는 길이 더 위험하기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쇠막대 손잡이에 더욱 힘을 주며 말이다.
평평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김밥과 김치를 안주삼아 막걸리를 한잔 마시니 그야말로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겨울이 아니라 다른 계절이었다면 돗자리라도 깔고 한숨 자면 딱 좋겠네요.” 했더니 옆에 강동지도 그렇단다.
나름 막걸리 한잔에 겨울산의 풍류를 만끽하고 산을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만큼 내려가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 오전 11시경에 산을 오르기 시작하여 쉬엄쉬엄 쉬다가 점심 먹고 내려오니 오후 4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날이 흐려서인지 주위는 더 어둑어둑했다.
산행 후의 묘미는 뒤풀이라고. 누군가는 뒤풀이 때문에 산을 오른다 했던가. 시각으로는 이른 뒤풀이가 시작되었다. 포두부에 시큼한 홍어와 돼지고기, 그리고 묵은 김치가 곁들여진 포두부 삼합이라는 안주와 막걸리가 한상 푸짐하게 차려져 나왔다. 둘이서 부어라 마셔라를 반복하며 산행의 회포를 풀자니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왔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몇 잔의 술이 더 오가니 그 아쉬움도 잠시 사라졌다. 그러다 ‘다음에는 꼭 다 같이 와야지’하며 또 술잔을 채워갔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안 밖은 점점 더 어둑해지고, 난 몇 개의 빈 술통을 바라보며 ‘내일은 아마도 몸져 누워있겠구나’하고 생각했다.
글 │ 김현하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