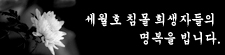오늘도 물을 먹지 못했다.
벌써 이주가 지났다. 난 괜찮지만 온몸으로 향을 내뿜는 가녀린 로즈는 조만간 무슨 사달이라도 날 것 같다. 벌써 조금씩 몸이 말라가는 것이 보인다.
그 옆에 머리가 위로 길쭉한 산세는 아직도 끄떡없다. 자기 말로는 한 달 넘게 물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독야청청 혼자만 멀쩡하다. 게다가 못 보던 새파란 아이들까지 붙어서 올라와 있다. 그 옆에 테이블은 ‘나 죽었소’ 하는 모습으로 있는 팔을 다 펼쳐 놓고 축 쳐져 있고, 벽 위에 매달려 늘어져 있는 아이비도 머리는 밑으로 향한 채 노란 머리를 하나둘씩 드러내고 있다.
난 석 달 전 이 집에 왔다. 주인은 검은 고무 옷을 입고 거리에 있던 나를 데리고 와서 하얀 도자기 옷으로 갈아 입혔고, 거기다 노란색 액체의 영양제도 놔 줬다. 그러나 이런 친절은 딱 거기까지였다. 그 뒤론 내가 몸집이 불어나고 노란 머리가 생겨도 옷을 바꿔주거나 머리를 잘 뽑아주지도 않았다.
난 처음 주인의 행동이 초보답지 않아서 이 집에 많은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집엔 로즈와 산세, 테이블, 아이비밖에 없었다. 거기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태양마저도 만나기가 어려웠다. 이 집 아이들이 거리의 아이들보다 왠지 병약해 보이는 이유였다.
예전의 난, 옷은 비록 남루할지언정 매일 태양을 볼 수 있었으며 줄페페, 꽃기린, 바위취, 호야 등 다양하고 많은 아이들과 거리에서 재잘거렸다. 그건 나에게 있어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기에 이 집에 오고 나서는 사라진, 그런 소소함이 무척이나 그리웠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주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난 그녀에게 혹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불룩한 배낭을 메고 나가던 그녀가 떠올라서 그런 우려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하긴 주인이 나에게까지 자신의 일정을 구구절절 알리고 갈 이유는 없긴 하다. 그건 오로지 나만의 바람일 뿐.
열흘이 더 지났다.
로즈는 이제 마른 몸이 하나둘씩 타들어 가 누군가 툭 건드리기라도 하면 머리칼이 다 부서질 것만 같다. 산세는 여전히 위풍당당했고 테이블의 팔은 이제 밑으로 더 내려앉았다. 나와 상황이 비슷한 아이비도 그새 노란머리가 또 늘었고 더 축 쳐져 말라가고 있다.
주인은 언제 올까?
아니, 물은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차라리 밖에 있었더라면 며칠 전에 쏟아진 비라도 맞았을 텐데.
잠시 후 밖에서 “계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두어 달에 한번 씩 오는 여호와증인인 것 같다.
난 애타게 ‘여기요. 물 좀 주세요!’라고 외쳤다. 아니 거의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게 맞았다. 그러나 나의 이런 울부짖음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혹 들린다 하더라도 주인이 아닌 이상 그들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들리지 않는 공허한 나만의 외침일 뿐.
몇 번을 더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그것도 멈췄다.
실내의 공기는 오늘 따라 유난히 후텁지근하게 더웠다. 이대로 가다간 산세만 남고 로즈, 테이블, 아이비, 나 넷은 그 수명을 다 할 것이다. 벌써 로즈는 거의 죽음에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듯 보였다. 혼자선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누군가의 손길만을 의지한 채 생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였다. 난 다음 생엔 오늘의 나로 태어나지 않길 기도했다. 그리고 서서히 체념하며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가 기울었는지 낮에도 어둠침침한 방안이 점점 더 깜깜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에서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방안에 불이 켜지면서 짧은 곱슬머리에 동그란 뿔테안경을 쓴 낯익은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주인이다.
방안에 들어온 주인은 장롱문과 서랍을 몇 번 여닫더니, 옷가지를 몇 벌 챙겨서 또 배낭을 쌌다. 하는 본새를 보니 또 어딘가를 가려는 모양이다. 한참을 부산하게 움직이던 그녀가 그제서야 우리가 눈에 들어왔는지 로즈를 한번 만져보고, 나랑 아이비도 한번 씩 만져본다.
“어머. 엄마 집에 며칠 다녀왔더니 얘들이 다 죽어버렸네. 물 안줘도 오래간다더니 산세베리아 말고는 다 거짓말이군. 로즈마리, 테이블야자, 아이비, 신고디움 다 죽었네. 에잇, 다음에 다른 걸 사다가 다시 심어야겠다.” 하더니 휙 나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아직 살아 있는데… 물 주고 가… 우린 어쩌라구…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나마 있던 나의 푸른 머리가 노랗게 변해 밑으로 떨어졌다.
‘내 다시는 식물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인정머리 없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저 여자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절대 가만두지 않으리라’
노란 머리 하나가 또 툭 하고 떨어졌다. ♠♠
김현하 | 누구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나 소설을 좋아하고, 한번 시도한 단편소설의 호평에 힘입어 착각의 늪을 헤엄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상은 나의 힘!
공공운수노조·연맹에서 일하며, ‘화초(花草)’ 무지 사랑함미다~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