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규 쉼표하나 3기 회원
친구 태홍이 보시게
난 봄바람과 함께 흩날리는 벚꽃을 봤어. 잘 지내고 있지. 어제도 봤는데 인사를 하려니 쑥스럽구먼.
화려하게 피었다 지는 벚꽃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니? 난 벚꽃을 보면 너의 결혼식이 생각나. 그러고 보니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겠구나. 네가 결혼한 날도 오늘처럼 벚꽃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벌써 15년 전이네.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회관 결혼식장이지. 난 그때, 너의 부탁으로 축의금을 받았어. 하객들이 건네는 축의금을 받으면 난 감사 인사와 함께 금액을 확인하고 봉투에 적는 일을 했다. 하객이 뜸할 즈음, 벚꽃을 봤어. 영화 〈4월 이야기〉의 한 장면 같았다. 왜 그때 벚꽃이 보였을까. 결혼식에 늦을까봐 급하게 왔을 때는 안 보였는데···. 그때 내 마음은 이런 봄날에 결혼하는 네가 부러웠고, 머리맡에 하얀 속내를 드러내고 떨어지는 벚꽃을 혼자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도 했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우리의 봄날이었다. 이 말을 하면 너는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하겠지. 그래서 지금도 고마워. 2001년 2월로 기억한다. 인사동 허름한 술집, ‘이모네’에서 우리 둘이 자주 소주를 마셨지. 그때 각 한 병을 지나 소주병이 세 병쯤 되었을 때, 난 인도에 가겠다고 너에게 선언했어. 따뜻한 곳을 가고 싶다는 마음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이 있었지. 또 IMF 백수 생활에 많이 지쳤어. 실직 6개월이 되었을 때였지. 너도 물론 마찬가지였어. ‘같이 가자’는 제안은 빈 술잔 밑에 놔두고 왔지. 그리고 난 바로 인도에 갔다. 김포공항에서 인도로 떠날 때 너를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었던 기억이 난다.
‘인도에서 보낸 1년’은 정말 봄이었다. 인도는 나에게 많은 것을 선물했어. 우선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졌어. 우리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고 하잖아. ‘팔꿈치로 옆 사람을 누르고 앞으로 나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경쟁사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사회, 난 절벽에서 살아남으려고, IMF라는 벽을 넘으려고 숱한 노력을 했지. 인도의 1년에서 그런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경쟁이라는 자체가 ‘공멸’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 그리고 즐기면서 살기로 했어. ‘경쟁심’을 벗어버리기로 했어. 그러면서 인도에서 배운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 자리 잡았지. 무슨 일이든 노 프라블럼이야. 정말 문제가 없냐고. 문제는 있지. 그래도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한, 이제는 노 프라블럼이야. 인도는 취향을 바꾸기도 하더구나. 내가 액세서리를 좋아하게 될 줄이야. 커플 반지를 안 끼고 다닌다고 여자 친구의 타박을 많이도 받았는데 말이야. 그만큼 무엇을 몸에 지닌다는 것이 번거로웠어. 그런 내가 인도 여행할 때 가죽 목걸이 줄에 나무로 새긴 펜던트를 하고 다녔지. 그리고 오른손 손목에는 ‘미신가 팔찌(실팔찌)’, 왼쪽 손목에는 인도 은팔찌를 하고 다녔으니, 인도는 놀라운 곳이야. 지금도 가끔씩 팔찌는 하고 다녀.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를 지날 때면 기웃거리지. 아참 인도에서 귀도 뚫었어. 왼쪽 귀를 뚫었지. 어찌나 아팠던지. 지금도 뚫려 있는 왼쪽 귀의 작은 구멍이 만져지면 그때가 생각난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도 똑바로 보고 있지.
그때 정말 너에게 메일을 많이 보냈다. 2001년의 인도는 전화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메일을 많이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고 보니 편지가 처음은 아니구나. ‘여름밤의 크리스마스’를 보낸 ‘고아’ 해변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대해서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면서 봤던 수많은 밤들의 별들에 관해서도, 《오래된 미래》 책에서 읽었던 라다크의 붉은 산에 대해서도 너에게 메일을 보냈지. 기억나니.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길게 쓰고 오랫동안 전화 통화했던 곳은 ‘바라나시’였지.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서 봤던 죽음의 느낌, 갠지스 강과 연결된 바라나시 화장터의 불타는 시신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느낌 등을 생생하게 썼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넌 재미가 없었을 거야. 코끼리를 처음 본 아이처럼 내가 들떠서 마구 떠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워. 그
리고 무엇보다 고마웠던 일이 인도에서 돌아온 날, 공항으로 마중 나왔던 일이야. 나를 처음 봤을 때의 너의 그 표정은 잊지 못할 거다. 낯선 외국인을 보는 듯한 표정과 서울역의 노숙자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이 묘하게 섞인 너의 표정. 그리고 ‘빵’ 터진 너의 웃음소리. 나도 가끔 그때의 나를 보면 웃음이 난다. 가슴까지 내려온 덥수룩한 턱수염(나는 장비 수염이라고 자랑스러워했지), 아무렇게나 마구 기른 머리, 그리고 하얀색의 라다크 지역 전통 윗옷과 낡은 군용 바지. 나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 인도에서 돌아 온 지 얼마 안 된 2002년 늦은 밤, 서울역 지하도를 지나갈 때 친근한 눈빛을 받은 적이 있지. 왠지 동료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긴 수염을 깎았다. 현실로 돌아 온 거다.
태홍아. 그거 아니. 우리나라 아침 출근길 풍경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날, 나의 눈이 아직도 인도에 머물고 있을 때였지. 지하철 아침 출근길 풍경은 숨이 막혔어. 사람들은 생기가 없고, 옷이나 머리 스타일은 같으면서 한결같은 무표정. 난 다시 인도로 돌아가고 싶었어. 지금도 가끔 출근하면서 지하철 손잡이가 마구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가 기억 나 빙그레 웃지. 나도 이제 ‘그런’ 시민이 된 거야. 하지만 그 마음, 그 생각만은 잊지 않고 있어.
이제, 우리 둘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다. 총각으로 만났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유부남으로 달라졌지. 그 많던 머리칼도 듬성듬성 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머리는 빠졌는데, 살들은 왜 붙는지. 나잇살이라고 서로 위안을 삼지만, 우리 이제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자.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산에 다시 다니자고. 마지막으로 북한산에 갔을 때, 산은 두 시간 올라갔다 왔는데, 여섯 시간 술 마시느라 힘들었어. 그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산을 끊었는데, 이번에는 산에만 가자고. 술은 목만 축이는 정도로 마시고.
태홍아, 이제 정말 건강부터 챙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술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우리 오랫동안 만나서 술잔 부딪치려면 건강을 꼭 챙기자. 넌 자전거 타기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나는 수영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 산에는 같이 가자고. 잘 지내고 건강해라.
박은규 드림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images/header_login.png)
/images/header_configinfo.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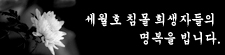


 2017년 두 번째 모임했어요
2017년 두 번째 모임했어요